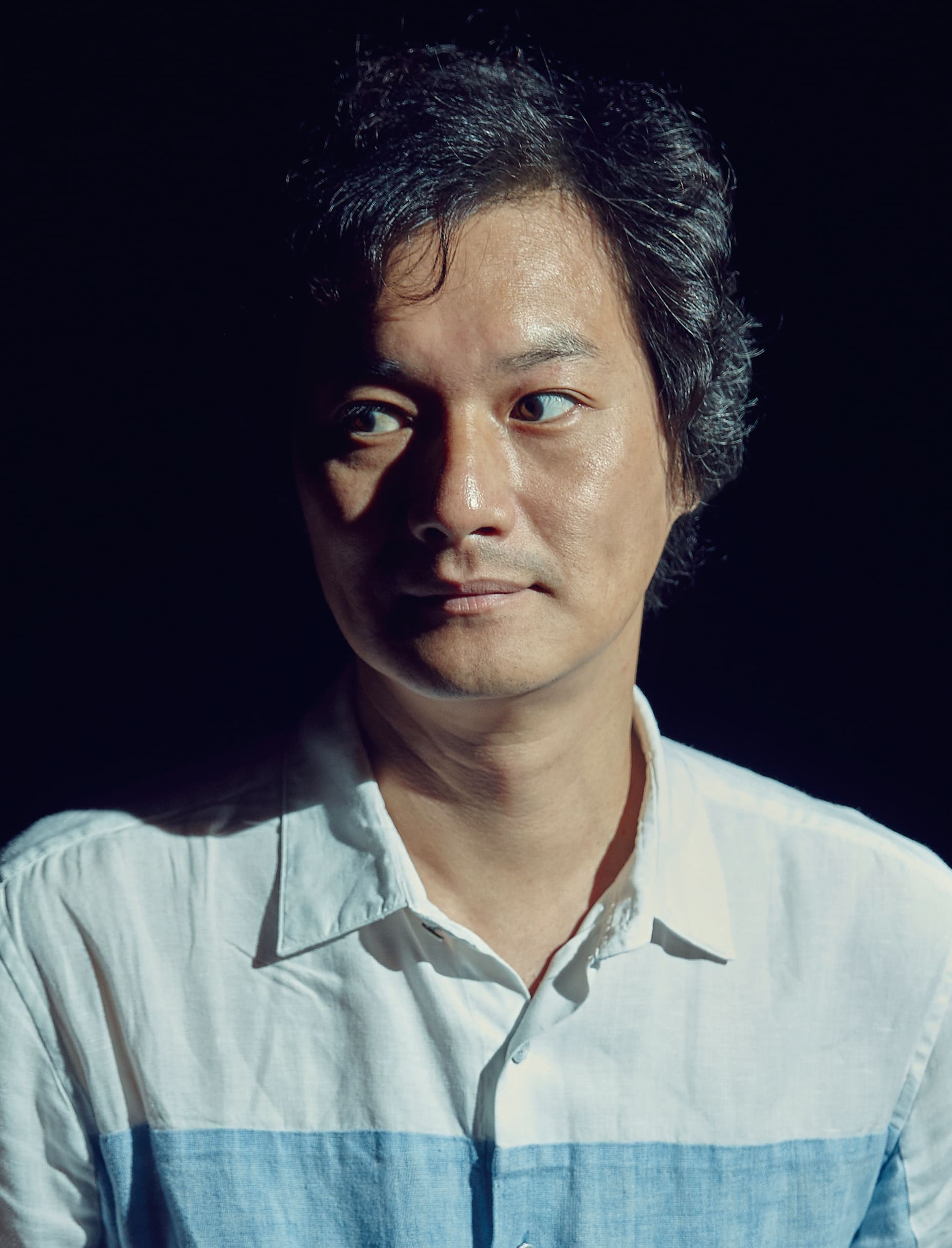연출가 헤르베르트 베르니케의 프로덕션은 ‘과거로의 회귀’에 손을 들어주었다
R. 슈트라우스가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장미의 기사(Der Rosenkavalier)’를 발표했을 때, 그것은 약 200년 전 스타일로의 회귀였다. 많은 양의 불협화음과 무조에 가까운 조성법, 전음계 등을 사용한 ‘살로메’(1905), 전위적 화성을 사용한 ‘엘렉트라’(1909)와 달리 완전히 고전적인 스타일의 음악이었다. 유럽 사회가 대변혁을 맞아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가 뒤집히고 새로운 것을 갈구하던 격동의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설정이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청혼의 전령사인 장미의 기사를 다시 만들어내고, 옛 시대의 유물이자 시대착오적인 왈츠나 연주한단 말인가. 20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둔 시점에서는 거의 역주행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래서였을까. 2004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캐나다 출신 연출가 로버트 카슨은 ‘장미의 기사’에 세기말적 페이소스를 불어넣었다. 왈츠가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기에 어김없이 왈츠 연주가 흘러나왔지만, 카슨의 프로덕션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저 낙천적으로 즐길 수 없게 만들어, 옛 시대의 끝자락에서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직시하게 만들었다.
바스티유 오페라에 오른 ‘장미의 기사’는 카슨의 반대편에 있었다. 이미 고인이 된 연출가 헤르베르트 베르니케는 R. 슈트라우스의 ‘과거로의 회귀’에 손을 들어주었다. 무대미술과 의상도 겸한 그는 18세기의 시대를 다가올 미래처럼, 반짝거리는 소재로 화려하게 재현했다. 극장의 문이 닫히자 필리프 조르당의 지휘로 서곡이 울려 퍼졌다. 18세기풍의 화려한 미장센이 펼쳐졌다.
화려했지만 아쉬운 무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육군 원수인 베르덴베르크 후작의 부인 마르살린 역은 소프라노 미하엘라 카우네가 맡았고, 메조소프라노 다니엘라 진드람은 젊은 귀족 옥타비안 역을 맡았다. 두 사람은 정열적인 밤을 보내고서 아침 새소리에 지친 눈을 뜬다.
헤르베르트 베르니케는 무대의 오브제적 장치들에 많은 메시지를 담은 듯했다. 두 사람이 뒹굴던 붉은색 침대는 어젯밤에 나눈 욕망과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무대 뒤에 설치된 11개의 이동형 거울도 배경용품이 아닌 전경의 오브제로 기능했다. 거울들은 움직일 때마다 다른 색과 문양의 벽을 연출해 공간을 바꾸었다. 거울이 라운드형으로 펼쳐지고 관객석과 마주할 때는 마치 원형 객석 한가운데 침대가 자리한 듯한 시각적 효과가 연출되어 마르살린과 옥타비안은 은밀한 연애를 나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욕망이 낳은 불륜은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듯했다.
베르니케의 연출과 무대미술은 간결했다. 청혼의 전령사인 장미의 기사가 나오는 2막의 무대에도 몇 개의 의자만이 놓여 있었다. 벽으로 사용된 거울에 18세기풍 문양과 장식이 비치지 않는다면, 무대는 단 몇 개의 의자와 거울로만 채워져 있는 셈이었다.
극중 조피의 집에서 벌어지는 장미 헌정 장면은 화려하기 짝이 없는 클라이맥스. 아름다움의 정점에 선 미소년 옥타비안이 은장미를 들고 계단에서 내려올 때, R. 슈트라우스 특유의 영롱한 음악과 함께 거울의 반짝거림은 무대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 프로덕션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빛과 반짝임의 변증’이라고나 할까. 메조소프라노 다니엘라 진드람의 목소리도 남성적인 중음보다는 무대의 분위기를 닮은듯 여성 그대로의 화려함을 내뿜었다. 또한 각각의 미장센에서는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의 장면들이 연상되기도 했다. 어쨌든 샴페인처럼 반짝이며 꿀처럼 달콤한 왈츠의 선율이 전편을 수놓는 로맨틱 코미디와 베르니케의 연출이 빚은 화려한 눈요기 외에는 그다지 감흥을 주지 못했다.
한국에서 ‘장미의 기사’는 애석하게도 서울시오페라단이 1996년에 선보인 이후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장미의 기사 모음곡’만 올랐을 뿐, 오페라로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인터미션을 포함해 약 4시간 동안 이어지는 R. 슈트라우스 특유의 빽빽한 오케스트레이션은 가수의 체력 못지않게 공연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 프로덕션이 한국 무대에 올라간다면 어떨까? 그리 환영할 관객은 없을 것 같다.
사진 Emilie Brouchon/O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