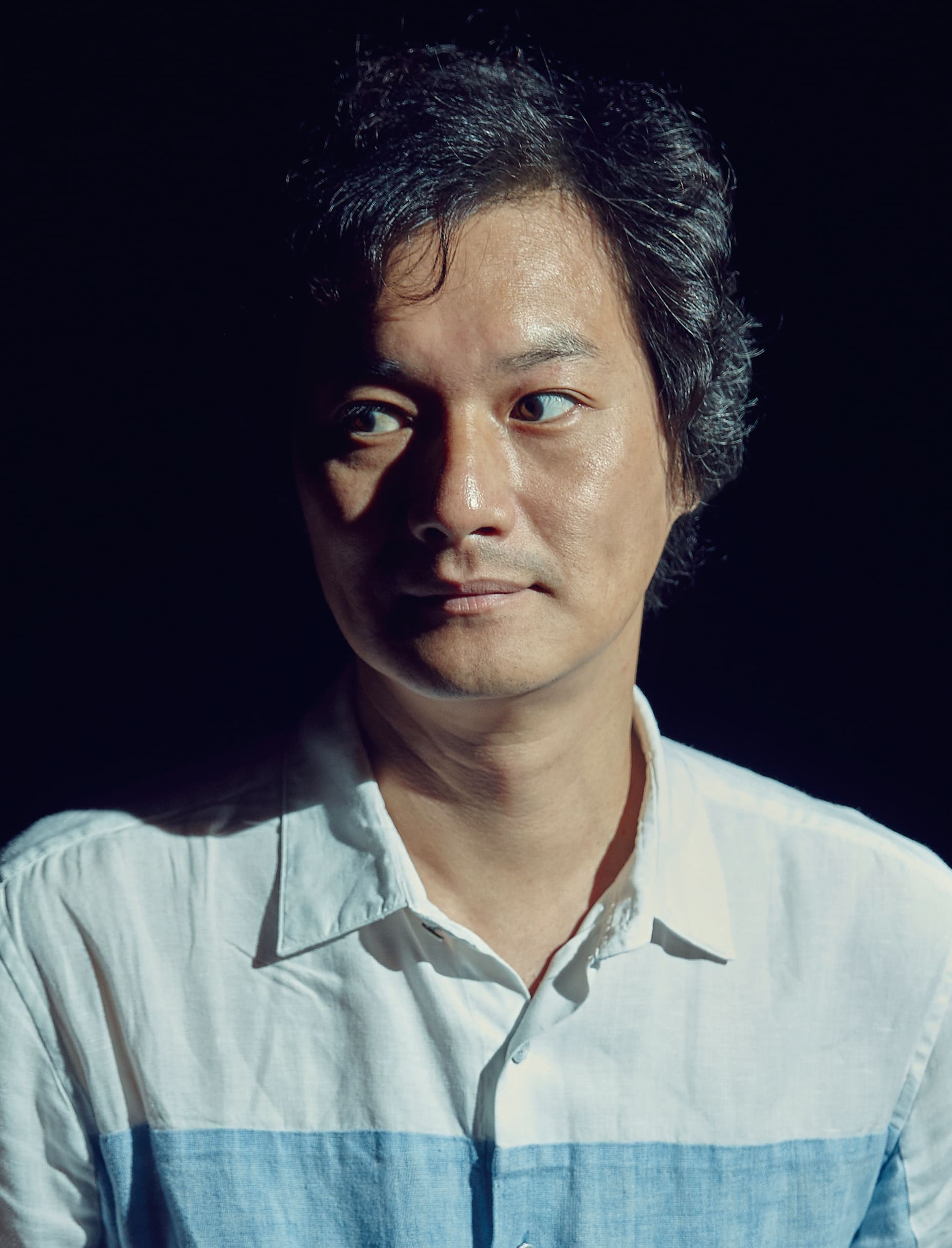3월 12일~16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근래 국립오페라단의 작품들은 해외 연출가들이 연출을 맡아왔는데, 이번 ‘돈 조반니’는 정선경이 맡아 눈길이 갔다. 뿐만 아니라 지휘를 맡은 마르코 참벨리를 제외하고는 합창지휘·코치·무대·의상·조명 스태프들은 물론 15명의 출연진 모두 한국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토종’이라는 데 내심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공연장을 찾았다. 공연장으로 가면서 살펴본 기사와 리뷰는 호평 일색이었다.
공연장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색다른 무대 커튼이었다. 트럭 뒤에 실린 물건을 덮을 때나 쓰는 공업용 천을 재현한 듯한 커튼이었다. 막이 오르자 삭막한 폐차장과 거대한 기중기가 무대를 가득 메웠다. 기중기에는 마그리트의 회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비현실적으로 큰 사과가 매달려 있었다. 기중기와 사과는 이 무대가 오늘의 모습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오페라 특유의 신화적인 요소가 겹쳐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개인적으로 성악가들의 땀과 열정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무대의 진행과 연출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페라의 ‘꽃’이어야 할 배우들이 무대 디자인과 연출, 그리고 진행을 위해 ‘희생’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성악가들은 작품 속의 주요 아리아와 이중창 대부분을 커튼 사이에 있는 좁은 무대에서 선보였기 때문이다. 커튼은 빈번히 내려왔고, 그때마다 성악가들은 널찍한 무대에서 쫓겨나 좁은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답답해보였다. 심지어 노래가 무대 전환의 소음을 감추는 데 이용된 것 같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리아와 이중창을 선보였던 풍경들은 공업용 포장지 같은 막과 함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연출가의 아이디어와 성악가들의 땀방울이 씁쓸하게 교차된 시간이었다.
송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