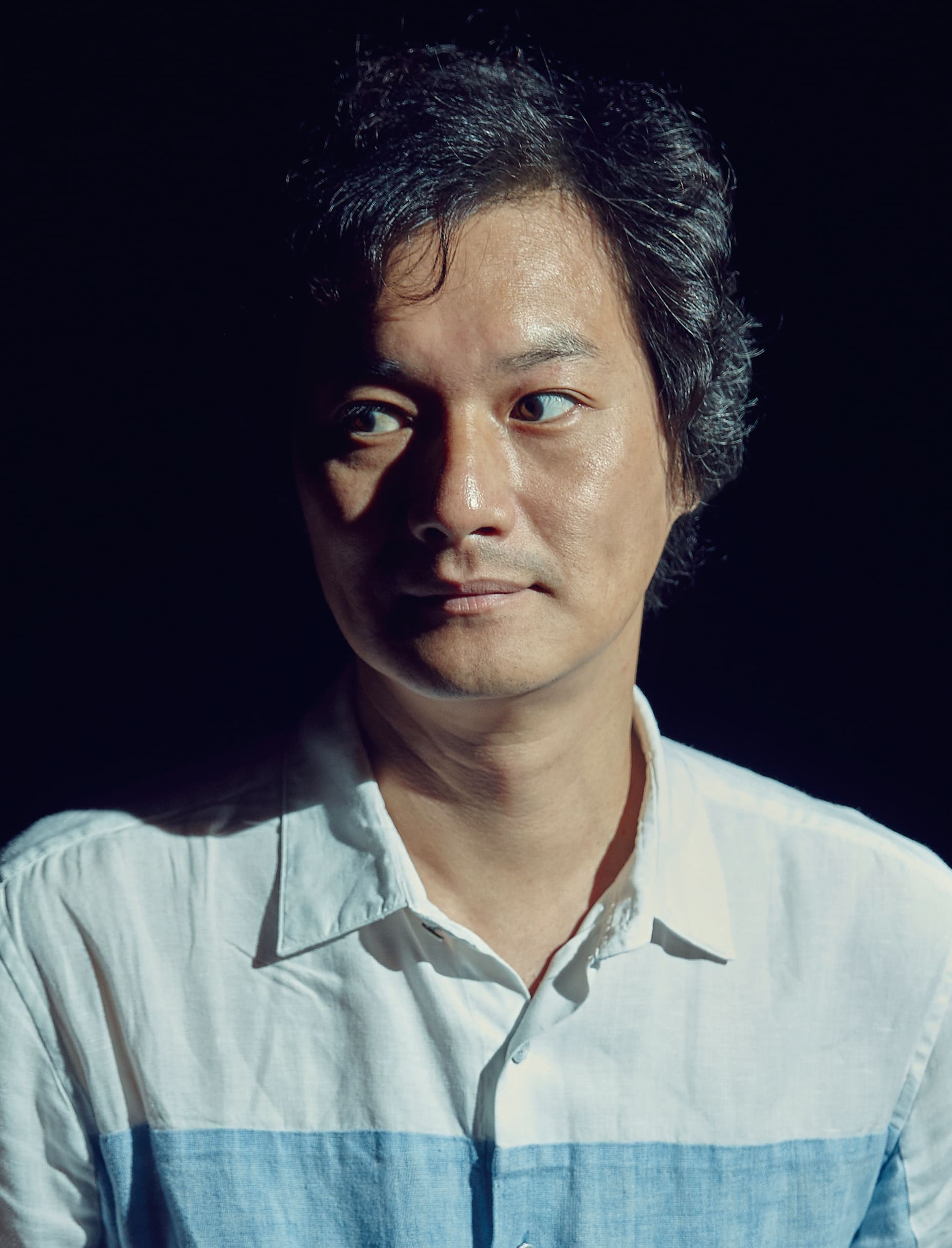2014년 11월 25~30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유일무이한 역사성과 엄격한 고전성, 사실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연출계의 거장 프랑코 제피렐리의 프로덕션이 2014년 11월 말 한국에 상륙했다. 오페라 ‘아이다1963’은 1963년 그가 밀라노의 라 스칼라 오페라하우스를 위해 설계, 제작한 프로덕션. 1988년 8월 세종문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푸치니의 ‘투란도트’ 이후 한국에 제피렐리의 프로덕션이 선보인 것은 26년 만의 일로 이번이 두 번째다. 사실 몇 해 전 제피렐리는 이미 훨씬 스펙터클하고 럭셔리한 ‘아이다’ 신버전을 제작한 바 있는데, 유독 구버전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아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기우에 불과했다. 유럽의 고전적인 걸작 프로덕션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한국의 실정에서 이 역사적인 1963년 버전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라 스칼라극장을 연상케 하는 듯 붉은색 무대 커튼을 위와 옆으로 길게 늘어뜨린 액자식 화면을 배경으로 1막이 시작되었다. 그림을 그려 넣은 막과 계단, 이집트 벽장식 구조물 사이에는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상 이상의 원근적 깊이감과 색채적 통일감을 보여주었다. 역시 제피렐리라는 감탄이 끝나기도 전에, 더 깊은 원근과 신비로운 황금빛 이집트 신전이 펼쳐진 출정식 무대가 등장했다. 마지막에는 제단에서 이시스상이 나오며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나일 강변의 낭만적인 분위기는 유화 톤의 그림 막을 통해 싱그러운 느낌까지 포착해냈다.
이 프로덕션의 하이라이트는 개선 행진 장면이었다. 도시의 주작대로를 배경으로 한 실물 스핑크스와 그림 스핑크스의 배열과 군대 사열이 무대 위에서 앞쪽으로 걸어 나오는 동선은 리얼리티의 사실적 원근감을 만들어내는 장면으로 단연 압권이었다. 여기에 화려한 무용과 다채로운 전리품, 색색의 인물들과 정교한 의상 등, 어느 하나 시선을 놓칠 수 없는 이 럭셔리한 미장센만으로도 제피렐리의 거장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재판과 감옥 장면은 어두운 배경으로 성악가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마치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는 듯한 순도 높은 질감과 색의 배합, 음영의 조화에 감탄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막 중간의 장면마다 무대전환을 하다 보니 전체 공연 시간이 네 시간이 걸릴 정도였지만, 매 순간 다양하고 강력한 무대가 펼쳐진 이 프로덕션은 제작된 지 무려 51년이 되었음에도 그 예술적 완성도와 보물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캐스팅. 원래 이 프로덕션을 홍보하기 시작할 때에는 피오렌차 체돌린스·일디코 콤로시·로베르토 스칸디우치와 같은 대가들이 온다고 했지만 결국 카를로 구엘피만 오게 되어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나스로 역의 구엘피는 조금 노쇠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3막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발성과 개성적인 연기로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 2015년 라 스칼라에서 주빈 메타 지휘로 ‘아이다’에 데뷔한다는, 흑인 소프라노 크리스틴 루이스의 호소력 짙은 음색과 연기를 볼 수 있었다는 데 위안을 받았다. 라다메스 역의 프란체스코 아닐레는 훌륭한 목소리와 정확한 딕션을 구사했고, 그 모습은 마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라다메스 분장을 한 채 사진을 찍은 카루소가 살아나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흡사했다. 하지만 1막의 아리아 ‘청아한 아이다’가 조금 불안정했고, 4막 끝 부분에서의 연속된 고음을 계속 놓쳐 못내 아쉬웠다. 성악적으로는 전령 역을 맡은 라파엘레 아베테가 이 프로덕션에서 가장 완벽했다.
사진 아이엠매니지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