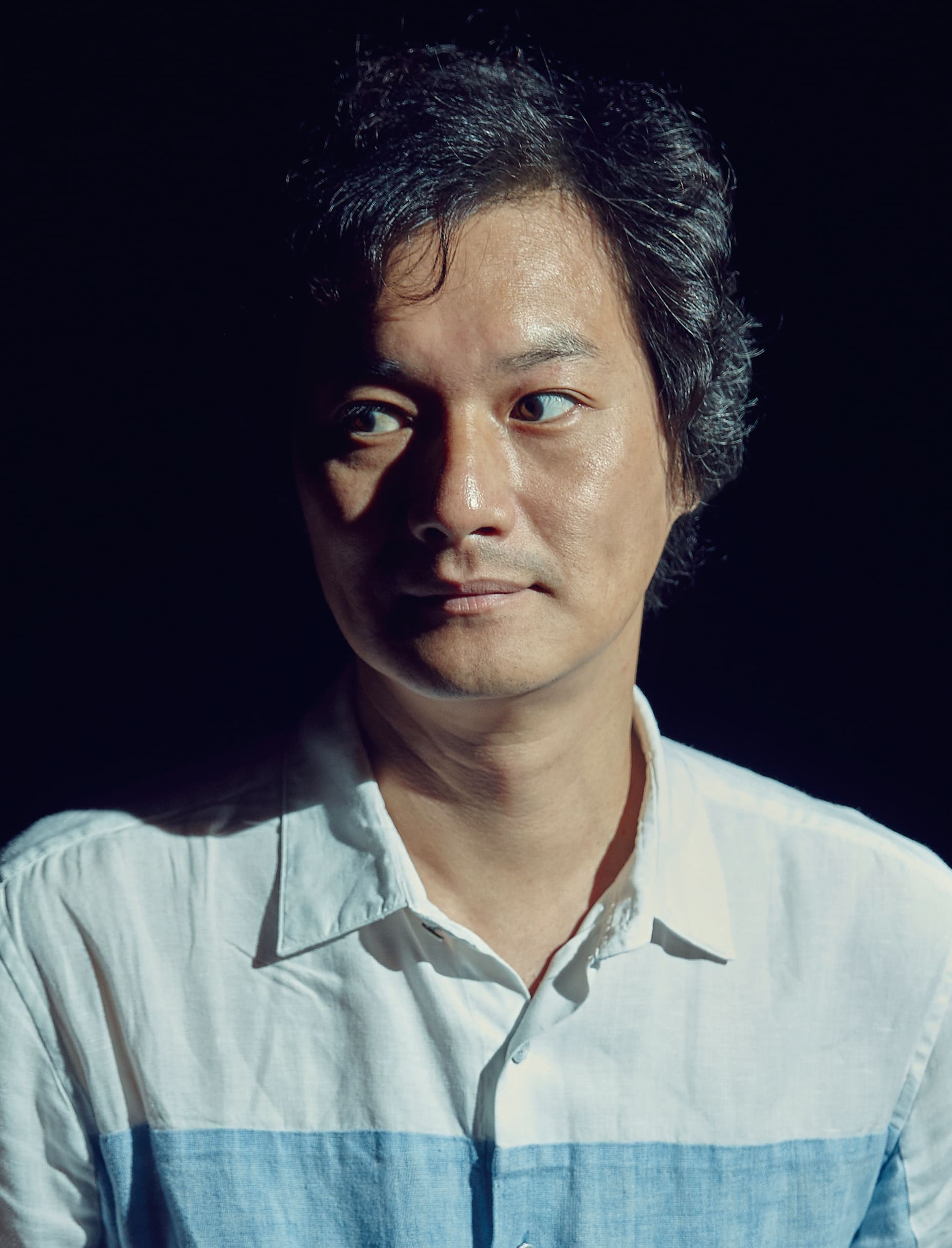한국 관객이 유명 오페라 작품만 좋아한다고 누가 그랬던가. 국립오페라단의 ‘팔스타프’는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았던 작품도 제대로 만든다면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시종일관 극을 밝고 즐겁게 이끈 연출가 헬무트 로너와 무대와 의상으로 산뜻함과 화사함을 더한 헤르베르트 무라워의 공이 컸다.
3월 21~24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글 장일범(음악평론가) 사진 국립오페라단
영국인 존 팔스타프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즐겁다. 자신을 매력적인 돈 조반니쯤으로 착각하는 뚱뚱한 허풍선이 팔스타프. 소싯적에는 날씬했다고 추억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뱃살을 진정 사랑하는, 이 못 말리는 착각남은 또 대단한 낙천가이기도 하다. 돈키호테·돈 후안·햄릿에 이은 또 다른 남자 유형이자 셰익스피어의 우스꽝스런 주인공 ‘팔스타프’를 국립오페라단이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작품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올렸다.
이번 공연에는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귀족 가문 출신 배우이자 연출가 헬무트 로너가 연출을 맡았다. 그는 시종일관 극을 밝고 즐겁게 이끌며 산뜻하고 화사한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 산뜻함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무대와 의상을 맡은 헤르베르트 무라워였다. 무라워는 영국적인 배경을 적극적으로 살려 스코틀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체크무늬를 무대와 팔스타프 의상에 사용해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팔스타프가 선창하는 피날레의 푸가 ‘세상 모든 것은 다 장난’을 전 출연진이 합창하면서 막을 내리는 장면은 인생을 한판 환희의 축제로 바라보는 로너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피가로의 결혼’ 등 ‘다 폰테’ 3부작에서 접할 수 있는 모차르트 앙상블의 매력을 비극 스페셜리스트인 베르디가 평생 제대로 쓰고 싶어 했던 오페라 부파인 ‘팔스타프’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더불어 배역 간의 긴밀한 호흡은 이번 작품이 오랜 연습 기간을 통해 섬세하게 다듬어졌음을 증명했다.
지한파 지휘자 율리안 코바체프는 코리안심포니의 사운드를 효과적으로 끌어냈고 성악가들의 앙상블에 시종일관 유효적절한 재미를 불어넣어 주었다. 알리체 역의 미리엄 고든 스튜어트와 딸 난네타 역의 서활란을 비롯해 퀴클리 역의 티치나 본 등이 특히 재미있고 탄탄한 앙상블을 들려줬다. 더불어 1막 2장에서 팔스타프를 골탕 먹이기 위한 작전을 짜는 9중창의 리듬감이 매우 잘 살아났다. 반면 메조소프라노 김정미가 소화한 메그 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묻혀 아쉬웠다.
팔스타프 역의 앤서니 마이클 무어뿐 아니라 미리엄 고든 스튜어트·티치나 본은 이미 이 작품을 30회 이상씩 해온 가수들답게 역할이 체화된 모습이었다. 난네타의 애인인 펜톤 역의 리릭 테너 정호윤도 소프라노 서활란과 함께 팔스타프와 윈저 가의 아낙네들과 비교되는, 아직 순수한 청년들의 연애담을 아름답고 사랑스런 이중창으로 소화했으며, 포드 역의 바리톤 이응광도 단단한 가창을 들려줬다.
국립오페라단의 ‘팔스타프’ 공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청중이 유명 작품만을 좋아한다는 편견과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되지 않아 즐길 수 없었던 오페라도 제대로 만든다면 관객의 호응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앞으로 무대에 빈번하게 올라가는 작품뿐 아니라 다른 오페라단이 쉽게 올릴 수 없는 작품들도 자주 제작하는 역할을 국립오페라단이 맡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국립오페라단은 매 공연을 시작하기 전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 ‘님로드’를 연주했다. 시즌 첫 공연을 열흘 정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국립오페라단 초대 이사장 이운형을 추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베르디 오페라의 마지막 대사 “세상은 모두 장난이야”가 귓전에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