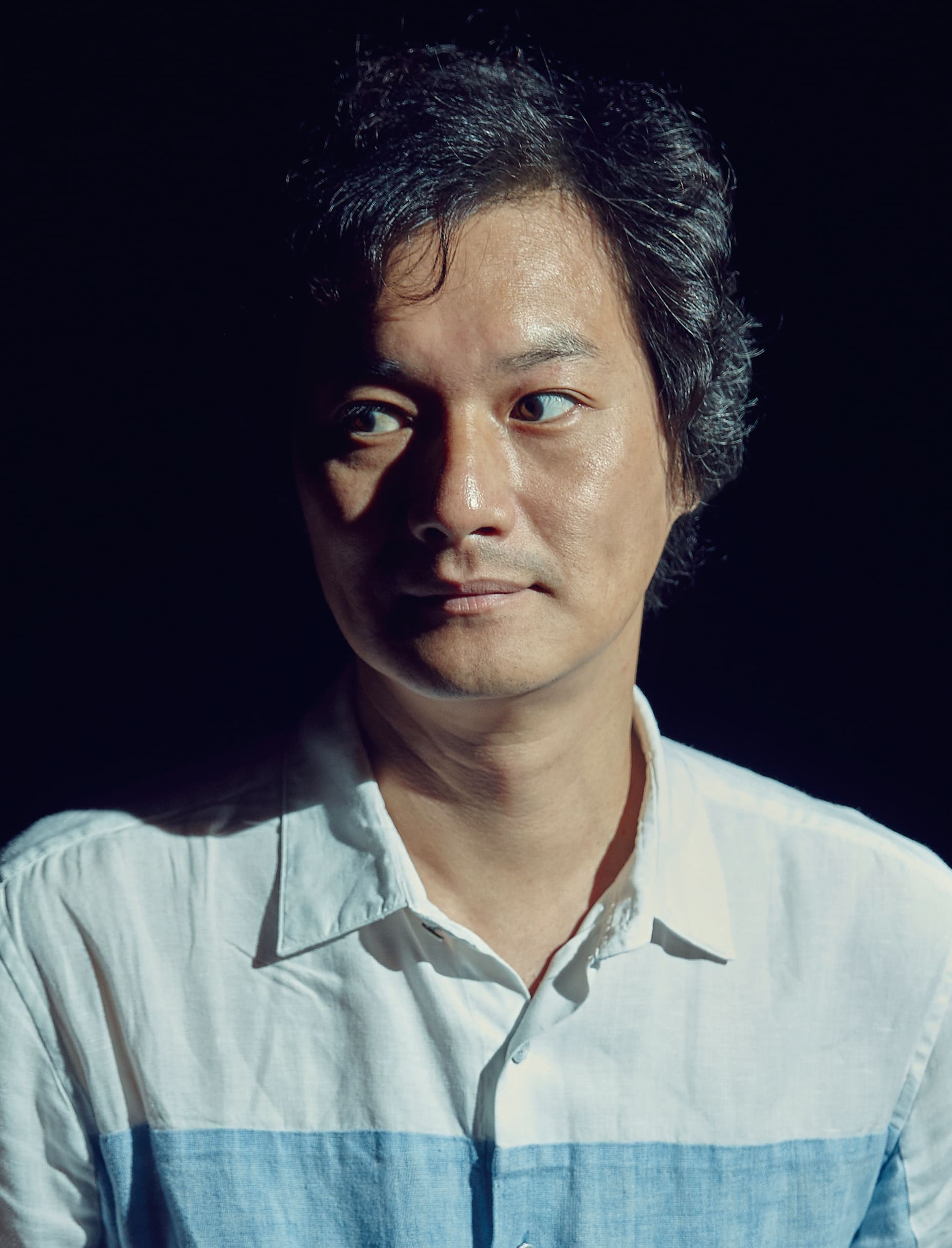어느 분야건 ‘다음 세대’가 없는 분야의 장래는 어둡다. 여기에서 다음 세대란 해당 분야를 이끌고 나갈 소수의 엘리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의 다음 세대, 즉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를 만드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음악의 생태계 자체를 넓히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를 길러낸다 한들 음악계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다. 8월 9~17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글 김상헌(2013 객석예술평론상 수상자) 사진 예술의전당
그동안 우리나라 예술 음악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 연주자를 길러내는 데 집중했던 반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예술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는 무심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일회성 이벤트처럼 공연되는 음악회들이 이러한 역할을 모두 수행하긴 힘들다. 게다가 이런 음악회의 상당수는 청소년들의 ‘방학의 적’, 즉 방학숙제나 수행평가를 해치우기 위한 기회로 활용된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무심코 건네준 책 한 권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지 않던가. 특히 예술적인 흥미나 취향은 대부분 어린 시절 형성된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청소년보다 어린이들에게 예술음악을 접할 기회와 경험을 마련해주는 것이 음악계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일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전당이 2001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여름방학마다 아이들을 위한 ‘가족오페라’ 공연을 꾸준히 상연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 공개된 가족오페라 ‘투란도트’ 예매 관객의 성별과 연령을 보면 40대 여성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는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며, 실제로 공연장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투란도트’가 ‘가족오페라’라는 기획 의도를 충분히 달성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공연 시작 전에 핑·팡·퐁의 배역을 맡은 성악가들이 아이들을 위해 작품과 작곡가에 대한 간단한 정보 및 오페라 관람 예절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거나, 공연이 끝난 뒤 성악가들이 무대 밖에서 많은 아이들과 사진 촬영에 스스럼없이 임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좋은 배려였다.
다만 아이들을 위한 ‘가족오페라’로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적절한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일이다. 지난 2009년까지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여름 방학마다 가족오페라로 공연했으나 2010년부터 새로운 레퍼토리로 ‘투란도트’를 선택했다. ‘마술피리’는 복잡한 계몽주의 사상을 잠시 접어두고 동화 속 왕자님과 공주님 이야기로도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부분이 대사로 이루어지며 이를 모두 한국어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족오페라로서 큰 장점이다.
하지만 ‘투란도트’는 가족오페라로 연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아이들이 많은 공연임에도 객석 예절과 관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으나, 다수의 어린이들이 많은 분량의 자막을 두 시간 내내 제대로 읽기 힘들어 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도 많았다. 뒷자리에 앉은 한 어린이는 공연 내내 “엄마, 선대(先代)가 무슨 뜻이야?”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질문은 했음은 물론, “엄마, 저 사람 왜 죽어?” “저 사람이 나쁜 편이야?”와 같은 질문도 자주 던졌다. 전 연령층을 위한 가족오페라일지라도 부모와 함께 공연장을 찾는 청소년이 많지 않음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두고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같은 작품을 레퍼토리로 선택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다.
비록 이러한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음악계의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을 위한 가족오페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의전당에서 기획한 가족오페라가 지난 13년 동안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하여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린 시절 잊지 못할 음악적 경험을 충분히 안겨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