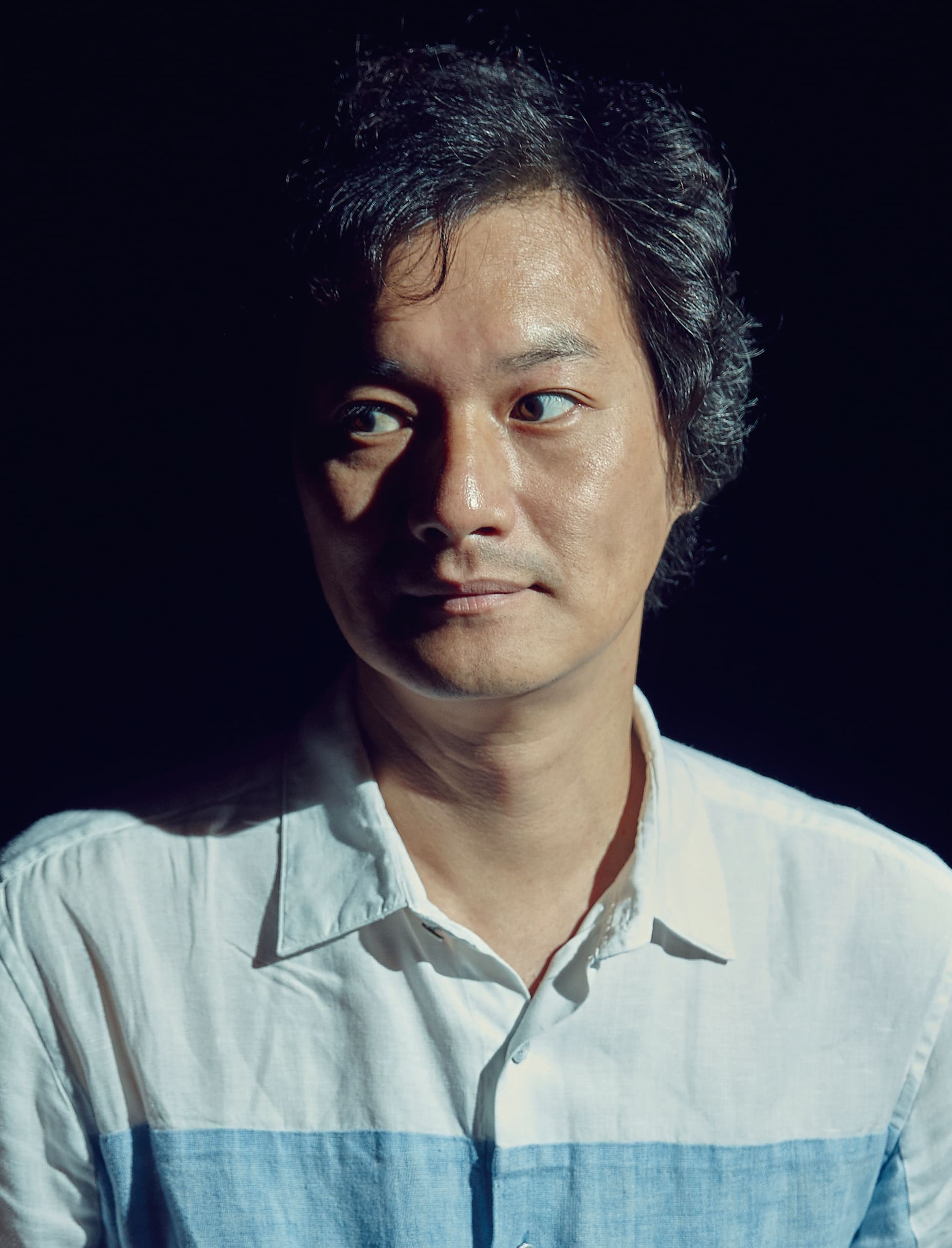4월
24~27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2004년 거장 연출가 로버트 카슨이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과 협업한 ‘라 트라비아타’는 수많은 프로덕션 가운데 문제작이요, 최고의 역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1막에서 마약 주사를 맞게 하는 등 비올레타를 학대하고 좌절케 하는 설정은 약자에 대한 사회의 부조리를 발가벗긴 상태로 고발해 섬뜩함마저 든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만난 ‘라 트라비아타’는 라 페니체 극장 버전의 화려한 유채색을 걷어내고 흑과 백의 무채색을 지향하며 비극과 불공정, 폭력성을 단도직입적으로 표출했다.
국립오페라단의 살림이 녹록지는 않을 터였다. 메트 오페라 수준의 무대와 의상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우리의 현실은 열악하다. 연출가 아르노 베르나르는 최소의 제작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종일관 검은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모든 스토리를 진행했다. 벽은 감옥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문이기도 했다. 결과는 설득력과 집중도 양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위해 오케스트라 피트에서는 ‘솔베이지의 노래’가 피어올랐다. 극도의 슬픔이 오페라보다 먼저 전해졌다. 막이 오르자 축제 장면은 정지됐고 비올레타만이 누워서 연신 기침을 해댔다. 시작 부분, 전날 3막에서 내리던 눈이 간간이 흩날린 것은 옥에 티였다. ‘나부코’ 이래 베르디 오페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합창이다. 연출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합창단에게 노래뿐 아니라 지독스레 연기를 시켰다. 검은 합창단은 수시로 동작과 정지를 반복하며 비올레타를 괴롭혔다. 쾌락을 극대화시키고 잔인하게 비올레타를 따돌렸다. 이는 2막에서 절정을 이루며 비올레타를 외면하고 돌아섰다. 청중은 약자의 편에 서서 강자만이 목소리를 내는 우리 사회를 떠올리며 통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리릭한 서정미와 여인의 서릿발 같은 절규까지 겸비해야 하는 비올레타는 난역 중의 난역이다. 조이스 엘 코리가 노래한 비올레타는 공연 내내 듣기 불편했다. “아, 그이였던가”로 시작하는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의 미묘한 메사 디 보체는 뭉텅뭉텅 깎였다. 그래서였을까. 2막 1장의 기나긴 시간들은 붉게 물든 무대 바닥과 상반되게 지루했다. 그나마 알프레도를 열연한 테너 강요셉과 바리톤 한명원이 분한 제르몽의 호연 덕택에 아쉬움을 달랬다. 캐스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무희 다섯 명이 등장해 뛰어난 볼거리를 제공한 2막 2장의 파티 장면. 투우사들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은 사디즘을 연상케 할 정도로 과격했다. 3막은 카니발과 동시에 과도하게 많은 눈가루가 쏟아져 내렸다. 비올레타가 침대가 아닌 의자에서 죽음을 맞는 설정은 억지스럽지 않았다.
파트리크 랑게가 지휘하는 음악은 극적이고 박력 있는 베르디 특유의 리듬 면에선 부족했지만 우리 악단을 짧은 시간에 조련해 연출자와 훌륭한 교감을 이루었다. 마치 브루크너 휴지(休止)처럼 정지된 시간을 활용하며 긴장감을 높이는 솜씨가 매력적이었다.
국립오페라단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정된 예산으로 최적화된 작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해왔고 이 작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국공립 공연장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다. 언젠가 국립오페라단이 음악 선진국처럼 전용 극장과 오케스트라, 합창단까지 갖추는 꿈은 그래서 희망적이다.
사진 국립오페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