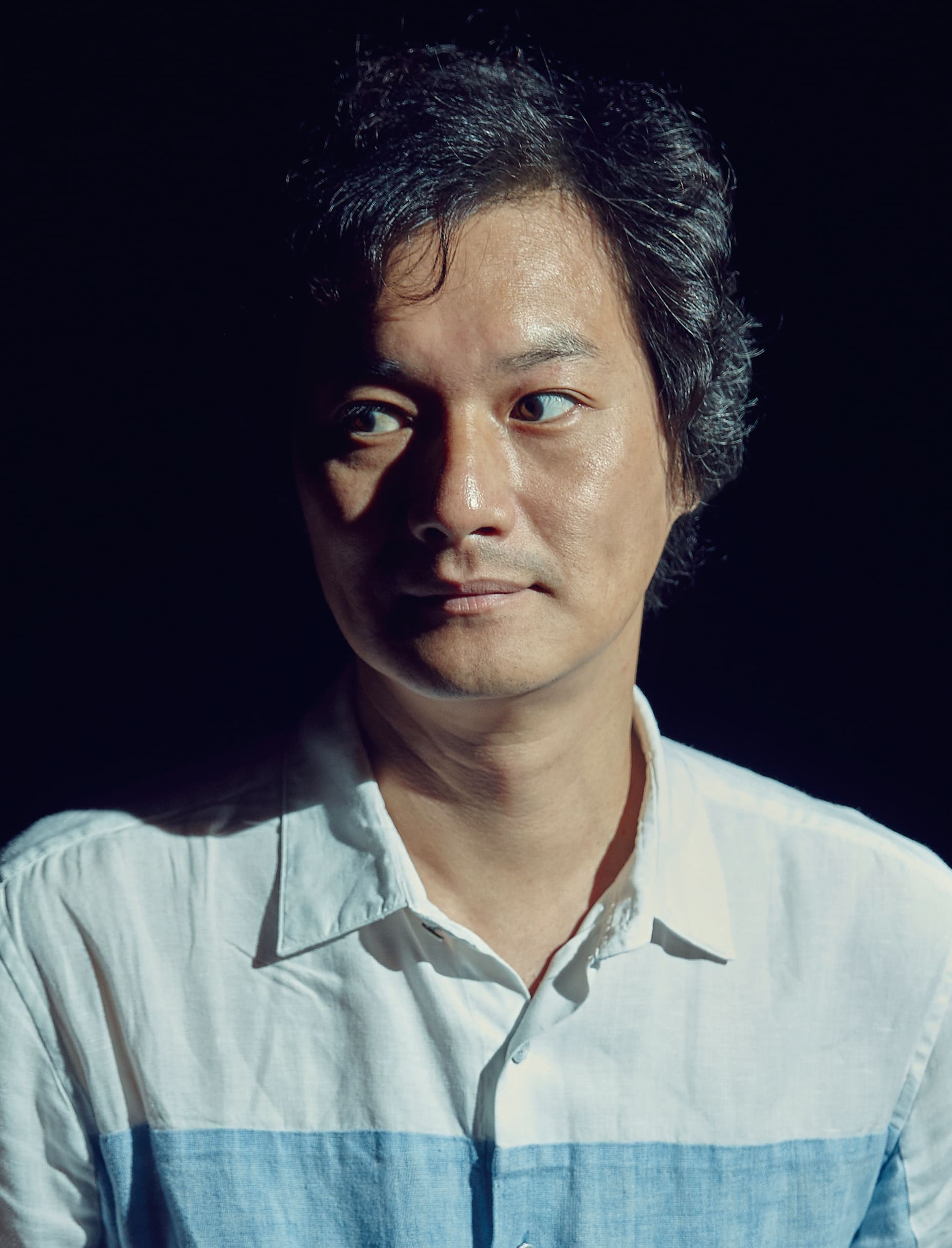“너도 한번 굴러봐라. 왕자님!”
지난 11월, 초연된 서울시오페라단(예술감독 이건용)의 창작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의 한 장면이다. 하지만 무대 위 왕자는 구르지 않는다. 왜? “굴러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왕자”로 “불러보라”는 대사였기 때문이다. 술집 마담 옆에 있는 여인 미나에게 날린 운율 섞인 대사로, 원래의 대사는 “너도 한번 불러봐라. 왕자님!”이다. 나는 “굴러봐라”가 “불러봐라”였다는 것을 양옆 스크린의 자막을 보고 알았다.
성악가들의 발음이 낳은 실수를 잠시 지적했지만, ‘달이 물로 걸어오듯’은 수작(秀作)이었다. 약 1시간 40분 동안 자막의 도움 없이 작품을 뚝딱 해치울 수 있어서다. 초입부. 아리아보다는 낭송의 기법을 택한 최우정의 음악과 한데 포개져 흐르는 고연옥의 대사는 ‘어라? 이거 자막을 안 봐도 되겠는걸’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선율 속의 대사와 노래, 성악가들의 발음은 뚜렷이 들려왔다. 중간중간 아리아가 나올 때는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귀만 열었다. 나는 음악을 감상하는 ‘청자’이지 자막을 읽는 ‘독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성공. 물론 자막으로부터 몇 번의 도움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도움이었다. 이를테면 경자(소프라노)의 대사 중 “묶네”를 “웃네”로, “반 달 후면”을 “한 달 후면”으로 고쳐 들은 것 정도다.
언젠가는 ‘친절한 자막’에 딴지를 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달이 물로 걸어오듯’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셈이다.
사실 우리는 모국어로 된 창작 오페라의 자막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바라본다. 왜? 작품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친절한 서비스’로 인식하기도 한다. 방금 전 놓친 대사를 다시 짚어주고, 벨칸토 창법에 섞여 전달력이 약해진 모국어를 구해내어 관객에게 전하는 구출자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막은 창작 오페라에 있어서 작품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존재다. 그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작품은 당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와 가사이든 아니든) 작품에 출연하는 성악가는 때때로 명확한 발음을 구사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래서 창작 오페라는 자막이란 존재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점쳐야 한다. 말을 덮지 않는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고, 음악을 살리는 말(대사)에 대한 탐색을 계속해야 한다. 가수들 또한 명징한 발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평론가와 관객의 평가도 냉혹해야 한다. 모국어와 음악의 잘못된 결합, 그리고 들리지 않는 노래와 대사에 대해 불편했다며 꼬치꼬치 따져야 한다. 그것이 창작 오페라의 발전에 달아주는 발전적 각주다.
‘까짓것, 자막 좀 보면 어때?’라며 나의 딴지에 딴지를 거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음악과 함께 이야기 들려주기를 전제로 한다. 자막이란 생산자(작곡·극작)와 화자(성악가)가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문법과 불명확한 발음을 두고 발생하는 관객의 반응, 이를테면 “뭐? 잘 안 들려!”와 같은 불만을 미리 봉쇄하는 장치는 아닐까.
자막과 발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또 다른 작품은 소리꾼 이자람이 만든 판소리 단편선 ‘추물’과 ‘살인’이다. 이 공연은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리꾼 김소진과 이승희의 노래는 문장 하나하나를 형광펜으로 줄치듯 명징하게 들려왔다. 이자람은 단편소설을 소재로 한 이상, 소리에 녹아든 문장을 또박또박 불러주고 읽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만든 듯 했다. 여기에 두 소리꾼의 발음 구사력도 한몫했다.
그래서 음악의 뼈대가 된 주요섭의 소설은 소설대로, 이자람의 음악은 음악대로 높은 완성도를 갖게 된 것이다. 소리꾼이 갖춰야 할 덕목을 단가 ‘광대가’에 담아 강조했던 신재효는 “좋은 발음으로 아니리를 잘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명제에 이자람은 소리꾼으로서, 판소리를 이용한 이야기꾼으로서 잘 부합한 셈이다.
오페라나 판소리는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명확한 발음은 필수다. 그 이전에 발음을 철저히 고려한 작품이 나와야 한다. 목표는 단 하나다. 자막 없이 음악과 함께 이야기를 명확히 ‘듣는 것’에 있다.
음악이란 눈보다는 귀로 먹는 문화적 양식이다. 찌그러진 발음, 말과 음의 잘못된 결합이 낳은 명확하지 않은 노래와 대사들은 더 이상 자막의 힘을 빌려 존재하면 안 된다.
사진 서울시오페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