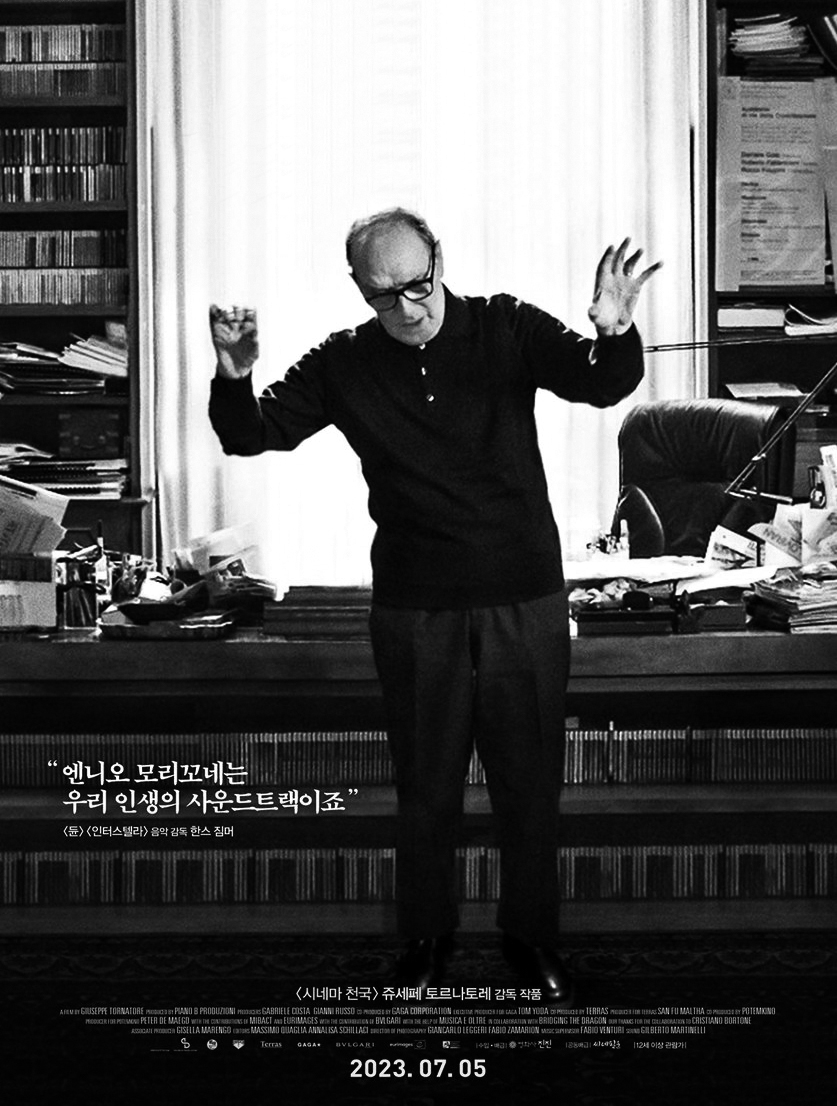글 김호경(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현대카드

‘RE:ECM’전 8월 22일~2020년 1월 5일 소마미술관
‘현대음악’이라는 용어는 얼마나 모호하고 또 무책임한가. 20세기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음악을 우리는 여전히 현대음악이라 부르고 있다. 서구 전통음악 계보 위에서 ‘현대음악’이라는 장르는 도무지 하나로 규정되지 못한 채 계속 부유하며 이어진다. 아마도 바로크 음악이나 낭만 음악처럼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개개인의 영감과 기획에 의해 다양하게 기록된 기호(記號)는 기술을 매개로 온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듣는 이들은 흐르는 이야기를 붙잡아 저마다의 방식대로 무한히 소유하며 즐긴다. ECM은 현대음악의 이러한 정체성을 실체화하는 레이블이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ECM이 특별한 전시를 열고 있다. 넓지 않은 전시 공간에서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 건 드로잉 작가 샘 윈스턴의 작품이다. ECM에서 발매한 존 케이지의 음반 ‘As It Is’에 수록된 음악을 반복해 들으며 그에 대한 반응을 그림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음악 듣기’의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을 모호하게 하는 윈스턴의 작업은 현 사회에서 음악의 역할 및 ‘모양’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번 전시의 특징을 말로 표현하자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음악’이다. 혁신적인 작곡가들에 의해 마디의 구분을 지우고, 서사를 지우고, 방향성을 잃은 채 떠도는 듯한 현대음악의 특징을 표현하듯 전시장 안의 여러 음악적 요소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라스 울리히와 마티스 니치케의 작품 ‘Flow’는 추상적인 움직임의 애니메이션으로 음악이 지니는 ‘흐름’을 상징하고, 니치케의 또 다른 설치 작품인 ‘Small Places’는 전시가 끝날 때까지 ECM의 음반을 계속 재생한다. 얇은 천 하나로 구분된 두 개의 공간이 번갈아 비치는 조명에 의해 무대 및 객석의 역할을 바꿔가며 하는데, 음악을 통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여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바로 옆 벽면에 걸린 키스 재럿과 만프레트 아이허가 탁구를 치는 사진으로 더욱 극대화된다. 서현석과 하상철의 VR 작품 ‘평행선’ 역시 아이허와 이름 없는 음악가 사이에 오가는 상상의 대화를 특정 공간 속에 연출해내며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선사한다. ECM의 팬이라면 앨범의 커버 이미지를 레이블의 특징적 요소로 꼽을 것이다. 마치 추상화 같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물이나 자연의 사진을 미니멀하게 디자인하는 게 ECM의 개성이다. 아이허는 아마 귀로 듣는 풍경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커버 이미지가 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간의 음반 이미지 중 200개가 투명한 판에 인쇄되어 전시 공간 속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패턴으로 설치되어 있다. 마치 움직이듯 서로를 관통하며 관객에게 즐거움을 준다. 1969년, 독일의 더블베이시스트 출신인 만프레트 아이허가 재즈를 기반으로 설립한 독립 음반사 ECM은, 1984년부터는 ‘ECM 뉴 시리즈’를 병행하며 클래식 음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1,60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고 작곡가 아르보 패르트, 피아니스트 키스 재럿·칙 코리아, 기타리스트 팻 메시니 등이 함께 했다. ECM이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면서도 늘 비슷한 ‘무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아이허라는 인물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음악가의 어떤 음악을 담을지, 어떻게 구현할지, 커버 아트는 어떻게 디자인할지 전부 결정한다. 아이허의 호와 불호가 레이블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인데, 잡스가 없는 애플처럼 아이허가 없는 ECM도 오래도록 많은 이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괜한 걱정을 미리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