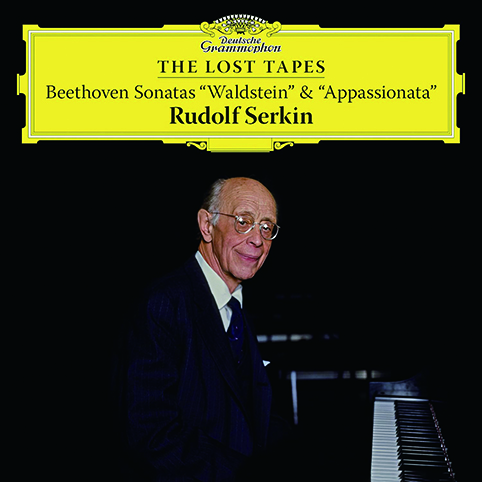EMI ‘홈 오브 오페라’ 시리즈가 무티 지휘의 베르디 ‘에르나니’ ‘맥베스’, 하이팅크 지휘의 바그너 ‘반지 4부작’을 출시했다. 재킷 이미지로 음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대신하며, 송준규 필자가 무티와 베르디, 하이팅크와 바그너의 인연을 전한다. (편집자 주)
무티, 마지막 베르디안
리카르도 무티는 제임스 러바인과 함께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베르디 지휘자이다. 귀도 칸텔리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듬해 겨우 27세의 나이로 피렌체 5월 음악제의 수석지휘자 겸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이후 밀라노 라 스칼라를 거쳐 현재의 로마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무티의 지휘 인생을 규정지었던 단 하나의 작곡가는 언제나 베르디였다.
평생을 베르디에 매진한 무티인 만큼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베르디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그의 첫 번째 베르디 전곡판이었던 ‘아이다’(1974)로 단숨에 시대를 대표하는 베르디 해석가로 인정받게 된 무티는 이후 ‘가면무도회’(1975) ‘맥베스’(1976) ‘나부코’(1978)로 그 성공을 이어갔으며, 1982년에는 ‘라 트라비아타’와 ‘에르나니’를 동시에 녹음해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986년 염원했던 밀라노 라 스칼라의 음악감독으로 취임한 이후 연달아 출시했던 베르디 시리즈들은 예전만큼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운명의 힘’(1986) ‘리골레토’(1988) ‘시칠리아 섬의 저녁 기도’(1989) ‘돈 카를로’(1992) ‘팔스타프’(1993)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전에 얻었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아틸라’(1989) 정도였다. 이후에도 계속된 무티의 베르디 시리즈는 ‘라 트라비아타’(1992, Sony)와 ‘리골레토’(1994, Sony)의 재녹음을 비롯해 ‘맥베스’ ‘가면무도회’ 영상물 등으로 이어졌고, ‘일 트로바토레’(2001)의 전곡판이 추가되었다.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호의적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베르디 서거 100주년이자 라 스칼라 재개장의 해였던 2001년 제작된 ‘오텔로’와 ‘팔스타프’의 영상물은 해당 작품들의 대표적인 명연주로서 거론될 만큼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사실 무티의 베르디 녹음들의 수준이 밀라노 시대에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이전 스튜디오 녹음들이 EMI가 불러모을 수 있는 최고의 가수들을 동원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던 것에 비해, 스칼라 시대 녹음들은 대부분 이탈리아 국영 방송의 텔레비전 방영과 병행해서 제작된 것들이기에 라 스칼라의 좋지 못한 음향 환경을 고스란히 가져왔다. 게다가 가수들 역시 만전을 기한 최상의 상태가 아니었던 것에 큰 영향을 받았다. 오히려 스칼라를 벗어나 제작된 ‘팔스타프’와 스칼라 재개관 기념으로 공연된 ‘오텔로’의 영상물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나, 최고의 준비 상태로 임한 2008년 잘츠부르크 축제의 ‘오텔로’에서 시종일관 내뿜어 나오는 압도적인 박력과 카리스마가 바로 우리 시대 마지막 베르디안 무티의 참모습일 것이다.
하이팅크, 무대를 사랑하지 않은 바그네리안
1929년생으로 올해 84세가 되는 네덜란드의 마에스트로 베르나르트 하이팅크는 콘서트 지휘자로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광범위한 레퍼토리의 소유자이다. 하이팅크가 녹음한 교향곡 작곡가들의 전집을 나열해보면, 세 번에 걸친 베토벤과 브람스의 교향곡 전집을 비롯해, 슈만ㆍ브루크너ㆍ차이콥스키ㆍ말러ㆍ쇼스타코비치, 그리고 본 윌리엄스 전집에까지 이른다. 이에 비해 오페라 레퍼토리는 다소 그 폭이 좁기는 하지만, 다루었던 작품의 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 다소 독일 오페라에 편중된 감은 없지 않으나 베르디나 야나체크·브리튼·드뷔시·심지어 차이콥스키나 스메타나의 오페라도 큰 무리 없이 소화해냈다. 반면 1978년부터 2002년까지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과 코벤트 가든이라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오페라 무대들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팅크가 과연 극장이라는 무대 자체를 사랑한 오페라 지휘자였는지는 의문이다. 그의 오페라 레퍼토리에서 완전한 공백으로 남은 푸치니나 로시니, 벨리니와 도니체티 등의 존재는 하이팅크가 사실은 무대의 힘이 작품을 넘어서버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전형적인 콘서트 지휘자였음을 방증하는 증거들이다. 그는 극장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작품을 지휘하고 싶어서 극장의 모든 어수선함을 참아냈던 것이다. 그 때문에 하이팅크는 청중의 박수와 가수들의 쇼 타임을 걷어낼 수 있는 바그너의 악극들을 특별히 선호했다. 오페라 지휘자로서 그의 주 레퍼토리는 결국 바그너였고 극장 무대에서의 은퇴를 선언한 이후 이를 접고 다시 극장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바그너 ‘파르지팔’을 지휘하고 싶어서였다. 하이팅크는 ‘탄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파르지팔’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니벨룽의 반지’ 등 중요한 바그너 작품 상당수를 무대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을 음반과 영상으로 남겨놓았다. 그의 바그너 해석은 과장된 무대 효과를 배제하고 음악 작품으로 타당한 모습을 되찾아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스타일의 해석은 우리가 바그너에서 기대하는 흥분과 도취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천될 만한 연주들은 아니다. 하지만 묵묵히 핵심만을 짚어나가는 하이팅크의 바그너 녹음들은 작품의 본질만을 추구하는 순수주의자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선택으로 남았으며 초심자들에게는 가장 친절한 교본의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한 세대 전 당대 최고의 성악진으로 구성된, 따라서 극장에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었던 조합으로 전곡 내내 무리하지 않고 핵심만을 파고드는 ‘링’은 하이팅크 바그너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 ‘명가수’를 포함시킨다면 무대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무대에 오른 우리시대의 위대한 바그네리안, 하이팅크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송준규(음악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