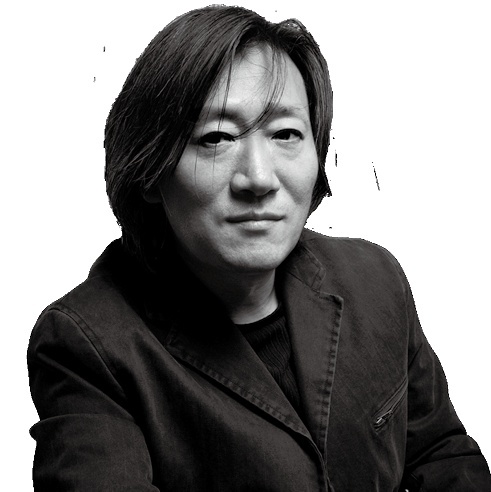일상 속 짧게 주어진 음악 감상 시간에도
여지없이 발휘되는 건축가의 창작 본능
사람들은 흔히 “틈이 나면 음악을 듣는다”라고 말한다. 이때 ‘틈’이란 것은 개인에게 안겨진 정신적 여유를 가리킨다. 어떤 이들에게 음악은 일상의 여유에 곁들인 하나의 문화적 기호품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음악을 듣는 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틈의 의미는 반전된다. 음악 듣기와 일상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음악을 떠나 있는 시간이 틈인 것이다.
작가의 이름으로 다사다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가 아니듯, 나의 내면은 늘 잡다한 생각으로 파도가 일렁인다. 그러다 내면의 파고가 잠시나마 평탄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나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앞서 언급한 정신적 틈에 해당하는 순간이다. 이 틈이란 달리 보면 지적·정신적으로 최적의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로 가득한 ‘퀄리티 타임(quality time)’이다. 문제는 이 퀄리티 타임이란 것이 작업을 위한 유연한 사고를 가동할 때에도 유리한 한편, 음악을 듣는 데도 공히 최적으로 열린 정신 상태라는 것이다. 작업하기에 최적인 퀄리티 타임에 음악을 들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작가란 놈이 과연 이래도 될까’라는 희미한 죄의식이다. 이런 점에서 음악을 듣는 행위는 나에게는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만의 음악 감상법이 생기면서부터 이 죄의식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고심 끝에 허무하게 퀄리티 타임을 날려버리지 않을 가치 있는 활동을 찾아낸 것이다. 이 방식을 거칠게 요약한다면 바로 음악을 ‘들으면서 듣지 않기’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은 감동이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매체를 훨씬 뛰어넘어 헤아릴 수 없는 정보가 극단적으로 집적된 하나의 유기체다. 음악을 ‘들으면서 듣지 않는 방식’이란, 음악이 흐르는 동안 각 작품마다 특유의 미적 경험을 안겨주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피거나 음악이 가진 정교한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밀하면서도 흥미에 찬 하나의 놀이인 동시에 문화 생산자로서의 본능이기도 하다. 나는 건축가로서 동시대 모든 지적·문화적·예술적 산물이 내세우는 한 가지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수가 없다. 창작가로서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내러티브를 들여다보고, 그 이면에 웅크리고 있는 근원의 사건을 더듬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들으면서 듣지 않을’ 때 스스로가 음악 전문가의 수준은 결코 아님을 인정해야 하고, 동시에 나아가 전문가의 입장이 되어서는 또한 곤란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내놓는 건축물이 제공하는 경험이나 인식이 그렇듯, 음악에 대해서도 될수록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을 놓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하여 나는 음악을 통해 청감을 두드리는 소리의 아름다움과 우수함에 대해 생각하며, 그리고 그런 류의 성분들이 건축에 줄 수 있는 미감과 함께 이것들이 과연 어떤 큰 그림으로, 또 미세한 그림으로 만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축 작업의 내용과 밀접한 음악의 아이디어를 꼽는다면 곡에 담긴 작곡가와 연주가의 삶이나 세상을 향한 시선, 스타일에 충실한 일관성, 이로 인한 구조적 탄탄함, 서사적 밀도감 따위를 들 수 있다. 알다시피 철학, 스타일, 구조라는 용어들은 건축에 있어서도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기도 하다.
반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음악을 촉매로 하여 얻는 것들을 든다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부분적 에피소드들, 예컨대 모티브의 기획이나 전략, 디테일에 깃든 교묘함과 정밀함, 또 악기라는 매체와 물성의 극적인 연출 등이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작품의 실험성이나 전위적인 면모, 기존의 기법에 대한 전복적인 저항의식으로부터 오는 호기로움도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외의 더욱 소소한 느낌들은 방심 끝에서 우연찮게 낚아채진다고 보아야 맞다. 이들은 대개 음악의 거침없는 흐름 속에서 지극히 순간적으로 명멸하는 신호들이기 일쑤여서다.
위와 같이 작가적인 아이디어 외에도 음악을 ‘들으면서 듣지 않는’ 일이 주는 또 하나의 미덕이 있다. 바로 음악을 가구처럼 취급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음악도 하나의 이미지와 같이 또 다른 차원의 우수함이 깃들 수 있는 잠재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나는 종종 마치 빈 공간에 가구를 둘러놓는 심정으로, 평은 좋지만 여간 친해지지 않는 음악을 틀어놓곤 한다. 마치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어쩐지 썩 와 닿지 않은 와인을 박스째 집안에 들여놓고 천천히 친화력을 쌓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무심히 공간을 채우는 음악의 볼륨을 형편없을 정도로 작게 줄이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반전을 겪게 된다. 음악이 도리어 우리의 대화에 숨죽여 귀를 기울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이쯤이면 어떤 경우든 내게 음악 듣기란 죄의식과 즐거움 양단을 일견 위태롭게 오가는 이벤트란 점이 다시금 확인된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그 둘의 함유율을 달리하면서 잡다하지만 자유롭고 경쾌한 만감을 누리는 시간이며, 동시에 미량의 긴장과 미량의 전율을 곁들인 작가적 생동감의 시간인 것이다.